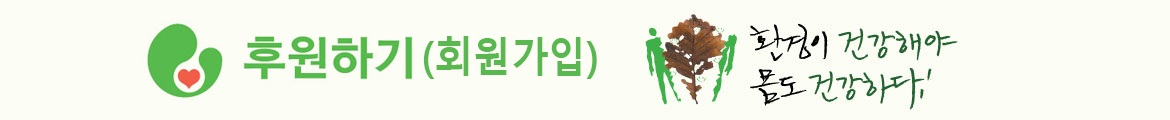[칼럼]환경오염사고 기업책임 강화해야
최예용
0
11578
2013.02.12 15:27
환경오염 사고, 기업 책임 강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3.02.12 00:33 / 수정 2013.02.12 00:33
또 불산가스 사고가 터졌다. 이번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구미산업단지에서 대형 불산 사고가 발생한 이후 벌써 네 번째 화학물질 사고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유해물질 누출 사고로 이제 국민이 집단 노이로제에 걸릴 수준이다. 문제는 이 사고가 우리 산업구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 주택가 옆에도 화학공장이 수두룩하다. 화학물질 배출량도 2002년 3만4000t에서 2009년에는 4만7000t으로 껑충 뛰었다. 사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기반은 취약하다. 구미 불산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은 매출액 900억원이 채 안 되는 중소기업이다. 대형 사고를 혼자 감당할 규모가 안 된다. 결국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 보전에 554억원을 집행했다. 사고 수습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형국이다.
피해 수습이 끝이 아니다. 환경오염 사고의 경우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피해 주민들이 언제 예전의 삶을 되찾을지 기약도 없다.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오염 사고도 며칠 전에야 판결이 나왔다.
이제는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1976년에, 독일은 91년에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엄격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는 잠재적인 가해기업으로 하여금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과 정부의 지원기금으로 신속히 구제를 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기간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할증한다.
기업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환경 사고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된다. 이런 안전망이 없다면 중소기업이 대형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킬 경우 거래가 끊기고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는 중소기업에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고, 환경 당국에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인 셈이다. 국내에도 이미 정책보험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보험금의 180% 이하는 민영 보험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이상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빈번한 환경오염 사고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대형 환경 사고를 겪으면서도 사후약방문 격으로 대응했을 뿐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수준도 높지 않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은 신한은행 한 곳만 선정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제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점 때문에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와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을 환경공약으로 내세웠는지 모른다. 이 공약이 조속하게 추진돼 하루빨리 환경적으로 건강한 선진사회가 되기를 여망해 본다.
윤 승 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잊을 만하면 터지는 유해물질 누출 사고로 이제 국민이 집단 노이로제에 걸릴 수준이다. 문제는 이 사고가 우리 산업구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 주택가 옆에도 화학공장이 수두룩하다. 화학물질 배출량도 2002년 3만4000t에서 2009년에는 4만7000t으로 껑충 뛰었다. 사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기반은 취약하다. 구미 불산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은 매출액 900억원이 채 안 되는 중소기업이다. 대형 사고를 혼자 감당할 규모가 안 된다. 결국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 보전에 554억원을 집행했다. 사고 수습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형국이다.
피해 수습이 끝이 아니다. 환경오염 사고의 경우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피해 주민들이 언제 예전의 삶을 되찾을지 기약도 없다.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오염 사고도 며칠 전에야 판결이 나왔다.
이제는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1976년에, 독일은 91년에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엄격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는 잠재적인 가해기업으로 하여금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과 정부의 지원기금으로 신속히 구제를 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기간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할증한다.
기업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환경 사고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된다. 이런 안전망이 없다면 중소기업이 대형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킬 경우 거래가 끊기고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는 중소기업에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고, 환경 당국에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인 셈이다. 국내에도 이미 정책보험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보험금의 180% 이하는 민영 보험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이상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빈번한 환경오염 사고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대형 환경 사고를 겪으면서도 사후약방문 격으로 대응했을 뿐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수준도 높지 않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은 신한은행 한 곳만 선정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제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점 때문에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와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을 환경공약으로 내세웠는지 모른다. 이 공약이 조속하게 추진돼 하루빨리 환경적으로 건강한 선진사회가 되기를 여망해 본다.
윤 승 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